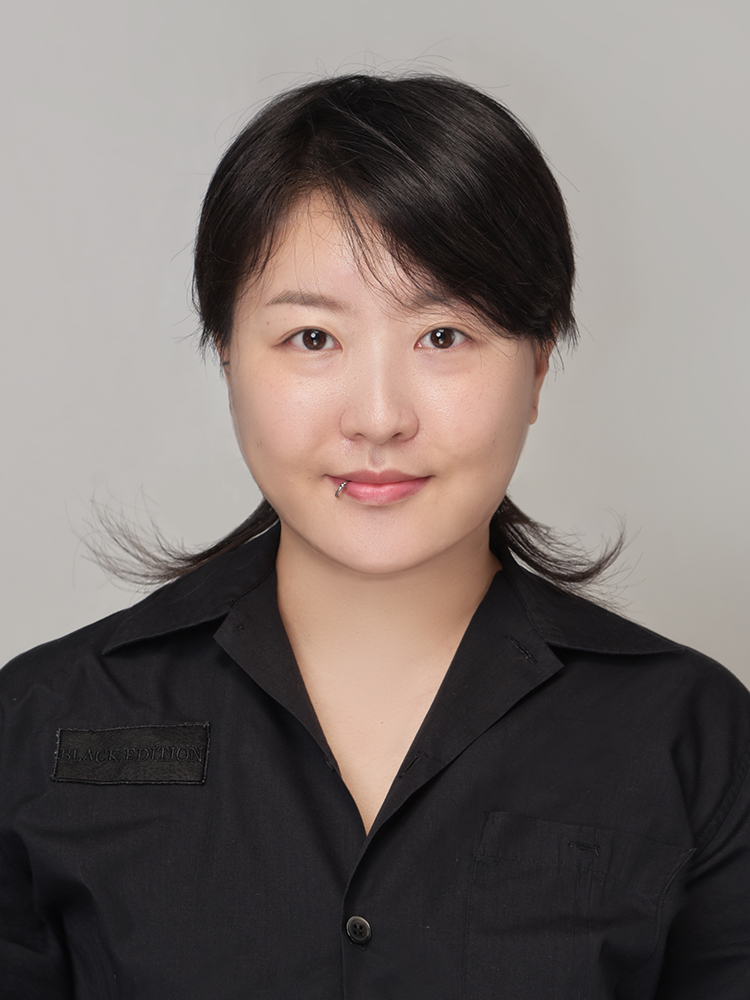마야 잉카 문명에서 발견돼 오랜 전통을 지닌 오카리나도 땅의 기운을 받은 악기다. 하지만 오카리나는 19세기 이탈리아 장인 버전 이후 어디서든 취미 악기로 흔히 쓰이고 있다. 그러나 훈은 특히 한국에서는 꽤 생소하다. 장구한 역사를 가졌지만, 제례악의 효과음으로서 예를 다하는 악기로 알려진 게 전부여서 훈의 쓰임이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5개 지공으로는 음이 매우 불안정한 악기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토속적인 비주얼과 음색으로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늘 실험의 대상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돈화문 국악당의 첫 커넥트 프로그램인 <흙의 소리, 훈의 소리>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매우 반색할 만한 시간이었다.
놀랍게도 ‘(송경근의) 송훈1) 공연’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맴버이자 공간 서리서리 대표 송경근이다. 개인적인 슬럼프를 극복하고자 공간 서리서리를 만든 그는 흙도자기 훈을 제작하면서 공간 서리서리의 프로젝트 그룹2)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송훈과 율기, 도경의 존재를 다방면으로 알리고 있다.
송훈, 율기, 도경 모두 흙을 원료로 한 도기 악기로서 송경근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 훈 연주회인 <도공지몽>(2018), 두 번째 <태고의 소리 흙의 울림 훈과 율기>(2023)>를 지나면서 송훈 연주법 또한 점차 정리되었다”고 밝힌 송경근 대표의 세 번째 연주, <흙의 소리, 훈의 소리>는 전통과 창작음악 그 사이를 지나며 송훈만의 레퍼토리로서 다시 관객을 찾았다.
인간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훈의 소리는 마치 땅을 밟듯 가장 낮은 곳의 감각을 마주하게 했다. 2025년 5월, 돈화문 국악당에서 열린 훈의 세 번째 공연에서는 흙이 가진 원형적 힘으로, 잊혀 간 전통악기를 복원해 전통에 새로운 정체성을 담아냈다.
![[크기변환]_서리서리1.png](http://sgtt.kr/assets/data/20250619062719_rgf717n.png)
물과 불과 흙
땅의 정령이 깃든 악기의 공명 때문인지 공연은 내내 꿈꾸듯 아늑했다. 송경근이 개량한 송훈과 도경 그리고 율기는 흙(점토)을 빚어 구워 만들어진 악기다. 역사적으로 이미 악기 재료 및 특성이 전해 내려온다. 『증보문헌비고』에는 고려시대, 아악의 유입과 함께 중국 고대 아악기 분류체계에 따라 8가지 음색 분류법이 등장하는데, 흙(토부)이 그중 하나다.
팔음악기3) 중 하나로서 흙은 토(土)라는 우주의 성질을 가진다. 이번엔 훈의 우주론이다. 『악학궤범』 권6 「악서」에 “훈은 입추의 음(音)으로, 밑바닥이 평평하고 구멍이 6개 있는 것은 물의 수(數)(이며), 가운데가 비고 위가 뾰족한 것은 불(火)의 형상이다. 훈은 물과 불이 합한 후에야 악기가 되고, 물과 불이 화(和)한 후에야 소리를 이룬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음을 피우는 훈의 제작 원리를 자연사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흙 재료로 만든 도경과 율기 또한 흙의 원리가 적용된다. 보통 경돌 혹은 옥돌로 만든 옛 편경은 아악 연주를 위해 중국에서 수입해 온 유율타악기인데, 항상 일정 음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천연 성질로 인해 음고 및 음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송경근의 도자편경(도경)은 흙이다. 팔음에서 밝히듯 자기4)를 뜻하는 돌은 흙과 달리 가벼운 소리라, 자기인 돌과 달리 음이 유려하다. 그릇 형태를 띤 율기 또한 울리면 울릴수록 내면에 와 닿는다. 명상음악 때 쓰이는 싱잉볼과는 또 달리, 평범함 속에 존재하는 비범한 아름다움이 포개진다. 그런 의미에서 송경근의 악기 교감은 아주 아주 오묘하고 비장하다. 악기의 형태 및 재료 등의 개량으로 시공간의 감수성이 원형으로부터는 변주됐지만, 청동기 시대 이전, 토기 등장과 함께 도구, 무구, 악기를 거친 훈의 오랜 정체성은 그럼에도 변치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크기변환]_서리서리2.png](http://sgtt.kr/assets/data/20250619062742_9ce3yhq.png)
여음(餘音)
명창 김소희 작창으로 알려진 <상주아리랑>5)을 시작으로 공연은 ‘송훈사운드’의 넓은 스펙트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총 10곡 중 <훈기상화>, <달달달>, <영산>, <바람길>, <엇노래> 등은 창작곡으로서, <상주아리랑>, <소편영산회상>, <송훈·아쟁 2중주>, <송훈산조> <송훈민요>는 전통음악으로서, 각기의 특성을 더해 송훈의 조화로운 매력을 발산해 보였다. 송경근의 창작음악극 <도자기 비밀>에서의 ‘엇노래’와 후속작 <훈기상화>의 ‘훈기상화’는 국악 동화곡으로 송훈과 율기의 드라마틱한 음률을 느낄 수 있었다.
‘훈기상화(壎器相和)’는 형제의 우애를 상징한 ‘훈’과 ‘지’라는 악기의 훈지상화(壎篪相和)를 바꾼 말로 (송)훈과 (율)기가 서로 조화롭게 어울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산>이란 곡에서는 임금 무덤에 악기를 묻는 역사적 사실 바탕으로 한 음악극 몇 장면을 짜임새 있게 무대화했다. 착한 도공인이 임금에게 드릴 도자기 편경을 만드는 도중, 신비의 산 영산에서 흙을 찾아 완성한다는 내용이다. 달의 형상에 빗대어 제작한 <달달달>은 마치 하얀 달이 3개가 떠 있듯, 커다란 하얀 율기 3대로 연주한다. 율기는 손으로 칠채를 연주하고, 첼로와 훈이 복잡한 리듬 위에 선율을 이어가면서 단연 관객의 몰입을 높인다.
반면, 전통바탕은 창작곡의 기품과 또 달랐다. ‘영산회상’이라 불리는 두 번째 곡 <소편영상회상>에서는 기존에 시도치 않은 도자기 편경 2개와 송훈, 장구로 새로 편성해 향피리를 대신해 부드러운 음역을 소화했다. 다섯 번째/여덟 번째 곡, 아쟁과의 시나위 <송훈·아쟁 2중주>/<서용석류 송경근가락 ‘송훈산조’>와 같은 전통음악 제스처 또한 송훈사운드의 정체를 더욱 확고히 했다. 심한 요성·퇴성으로 슬픈 느낌의 속성을 지닌 시나위는 태평소 곡조 대신 아련한 송훈으로 대체했다. 본래 미분음이 가능해야 하는 기악 독주곡이 바로 산조다. 효과음으로만 쓰인 옛 훈이 가진 5개 지공으로는 불가능한 곡인데, 지공 하나를 더 제작, 개량한 송훈이라 가능했다.
<서용석제 송경근류 훈 산조>는 2022 돈화문 국악당에서 진행한 <산조대전>에서 12분 길이로 첫선을 보인 작품이다. 2018년 초연부터 지금까지 공간 서리서리가 공들인 ‘송훈 사운드스케이프’는 어쿠스틱 하모니와 지공 추가의 기지로 12율을 완성하며 전통을 기치로 창작, 실험, 개성이 뚜렷한 글로벌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크기변환]_서리서리3.png](http://sgtt.kr/assets/data/20250619062752_qcdurzi.png)
뉴 아이덴티티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그랬듯 공간 서리서리 또한 전지구화된 예술적 실천으로 관객에게 ‘흙’이란 ‘원형적 감각’을 선뜻 소개했다. 더 나아가 감각의 원형을 모티브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전통’이란 ‘민족공동체’ 진영을 소환하였다. 송경근은 송훈 복원개량 후 가장 먼저 연주해 보고 싶은 곡이 <소편영산회상>이라 했다. 이는 한국 전통음악의 정수인 곡을 더 이상 중국의 수입 악기로서가 아닌 오롯이 한국 전통악기로 연주함으로써 진정한 한국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까닭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송경근의 복원과 창조는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 도자기 타악기 율기를 만들고, 전통악기 훈과 경을 복원했다. 이를 실현 시킨 복원과 창조의 힘은 무엇이고 또 그 실천의 근간은 무엇이었을까.
그에 의하면 “중국 훈을 한국 훈으로 속여 파는 일상이 송훈 제작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복원의 실천은 전통의 정체성 이슈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전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전통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고민되어야 할까. 정체성이란, 실체도 없고 고정적 본질도 없으며, 심지어 불변하는 것 또한 아니다.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듯 송경근 대표가 부여해 낸 송훈의 전통적 가치, 즉, 송훈이 갖는 잠재된 정체성은 영적 감수성을 지닌 전통의 속성만 있을 뿐, 인류에게 유구한 흙이란 존재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아이덴티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